
요즘은 개근하면 손해라고?

'개근거지'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언뜻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아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전장'이 된다.
여전히 어른들 눈에 '개근상'은 성실함의 상징이다. 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체험학습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간 애'라는 의미로 읽히는 시대가 되었다.
놀랍게도 요즘 교실에서는 "쟤 개근거지야"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성실하게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까지 추측되고, 심지어 조롱당하는 사회. 개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무언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우리 아이들이 개근을 하면 왜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야 할까? 그리고 왜 아이들은 더 이상 '출석 도장'에 의미를 두지 않을까? 오늘은 이 다소 낯설고 씁쓸한 단어, '개근거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변화,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개근거지'란?

'개근거지'는 최근 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해외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가지 않아 학교를 개근한 학생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개근'이란 성실하게 결석 없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지'는 해당 학생이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가족의 여건상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다는 점을 조롱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못된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지며, 이는 곧 "넌 개근이나 하는 가난한 애"라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이 단어의 등장 배경은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별명 짓기의 문화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내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자주 가는 학생들이 '인싸'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개근거지라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이나 학기 중 여행이 아닌,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일상을 보내며 개근상이 흔한 표창이었던 시대였다. 하지만 글로벌화와 중산층의 해외여행 보편화, 사교육 중심의 체험학습 확대로 인해 상황은 바뀌었다. 이제는 학교를 성실히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증거'로 비춰지며, 개근이 부정적인 낙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또래 집단 내 서열을 나누는 언어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외국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근한 따돌림이나 조롱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개근거지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소득격차, 체험 기회의 불균형, 비교 중심 문화 등 우리 교육과 사회가 가진 복합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체험학습 인정제도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가정 체험학습'은 일정 기간까지 공결로 인정된다. 교육부 '출결처리 지침'에 따르면 연 57일까지 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학부모와 아이가 자율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체험학습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적극 활용한다. 경제적 여유, 정보력, 시간적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개근이 일상이며, 체험학습은 꿈같은 제도에 불과하다.
개근거지라는 표현이 조롱의 화살로 전락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도는 평등해 보이나,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갈린다. 그 결과 아이들은 '쉴 줄도 모르는 애', '가난해서 여행 못 가는 애', '개근밖에 없는 애' 등으로 낙인찍힌다.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
문제는 비단 아이들 사이의 조롱이 아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를 반증한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수상 경력'과 '체험 이력'이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된다. 부모는 아이의 방학을 ‘스펙’처럼 설계하고, 학교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초등학생 중 46.3%가 '체험학습은 경쟁력을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했다(출처: KEDI, 「초등학교 교육환경 실태조사」, 2023). 이는 체험학습이 단순한 대안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비공식 입시활동’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는 과연 공정한 교육의 장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의 발화점인가?
마치며,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그들이 만든 단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개근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이는 아이들조차도 체감하고 있는 경쟁의 피로감, 인정의 갈망,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배제와 분열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요즘 애들 참 무섭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
'💡 Science > Social Sciences 사회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은 개, 검은 편견: '검은 개 증후군'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4) | 2025.05.08 |
|---|---|
| 트렌드세터, 시대를 앞서가는 이들의 비밀 (+정의, 종류, 티핑포인트 등) (10) | 2025.03.16 |
| 불확실한 시대의 군중심리 '펭귄효과' (+뜻, 발생 원인, 장단점 등) (11) | 2025.03.15 |
|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 새로움에 임하는 우리의 심리 (10) | 2025.03.15 |
| 친가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외가, 왜? (2) | 2025.0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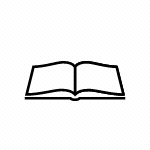







 }
}